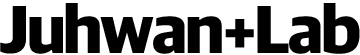에이전시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그간 경험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에이전시의 역할은 브랜드가 가진 비전과 가치를 디지털 환경 내에서 전문성을 더해 고객의 언어로 잘 만들어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보통은 브랜드에서 먼저 디지털 영역에서 브랜드가 가져가야 할 정성,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메시지의 방향성 등을 정리해 에이전시에게 전달하면 에이전시는 제안서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정제하고 임팩트 있는 키워드를 뽑아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메시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들만의 노하우와 실행력으로 디지털 내에 브랜드 포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라 하더라도 회사가 가진 목표와 방향성, 지향점은 내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마련. 에이전시의 업계 경험이 많은 담당자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팀이 브랜드를 심도 있게 스터디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조각 지식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흉내 내거나 추정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브랜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에이전시의 특성상 내부 직원만큼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간혹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에이전시의 대행 영역을 모호하게 이해하는 브랜드, 클라이언트가 있다.
우리 회사? 강점이 뭐더라
"나도 내 회사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경험 많은 당신이 우리 회사의 비전을 그려주시오"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담긴 RFP를 종종 받는데,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역할을 정의하고, 최초에 설정한 브랜드의 디지털 오너십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콘텐츠를 꾸려갈지 계획하고 실행, 분석하는 명확한 역할이 있다. 역할을 넘어선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 기업의 비전'을 그려달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요구일 수 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디지털 상에서 달성한 의외의 성과가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바꾸고 고객에 대한 새로운 정의, 어프로칭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다. 그런데 그 결정 또한 어디까지나 브랜드의 몫이다.
브랜드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역할 정의'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이 없이 모호하게 출발하면 모든 책임이 에이전시에 전가될테고 결국에는 '능력 부족', '무책임'의 결과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불만족스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찾으려 현 대행사를 제외해서 RFP를 배포하고, 또 다시 불만족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업계에 '기피 브랜드'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우리가 할 일, 당신이 할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역할 정의가 없이 브랜드와 에이전시 사이의 '파트너십'이란 없다. '갑을 관계'만 남을 뿐.
진짜로 기업과 제품, 브랜드는 만들었는데 비전, 가치를 찾기가 어려운 거라면 당장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 콘텐츠 하나 내보내고 검색에 걸리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둘게 아니라 경영 컨설팅부터 받아보는 게 옳은 순서일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