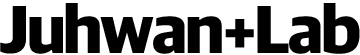(1)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웹에 대해 이해 좀 한다는 사람들이 서둘러 블로그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 환경이 구축되니 (2) 기업은 서비스형 블로그 플랫폼 자체를 만들고, 다른 기업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3) 페이스북이 등장했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업은 페이스북에 기업 페이지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쓰기 시작했다.

대략 2005년부터 10년이 넘는 변화의 흐름을 몇 줄로 요약해 봤다. 내가 소셜마케팅 영역에 일로써 발을 디딘 것은 '두 번째'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라고 했던가? '브랜딩'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나선 대기업들은 소셜마케팅 영역에 발을 담그며 '1위', '최초'의 타이틀에 목이 말랐고 소기업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역할로 각자의 그릇을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지나 플랫폼도 바뀌고, 일하는 사람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 녹아 있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공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압박, 기업 담당자는 이미 상사에게 보고한 가시화된 수치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 운영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는 담당자 대신 수치를 달성해 줘야 하는 압박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느끼는 힘듦의 모양새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성향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입맛에 쫓기듯 맞춰야 하는 건 큰 프레임 안에서 응당 치러야 하는 서로의 몫이다.
트렌드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할 의무
지금은 '스낵 컬처(Snack Culture)'라는 말이 흔하게 쓰인다. 시대를 반영하든, 소비자 성향을 대변하든, 한 달에 서너 개씩 쏟아지는 신조어들 중에 적당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과정이 이 바닥에선 늘 일어나는데 1 이 단어는 딱 마주하는 순간 뭔가 '불편한' 식감이 느껴졌다. 스낵 컬처. 쉽게 설명하면 '더 짧고,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깊은 의미를 담은 긴 호흡의 문장은 '안 읽힌다'는 건데, 너무도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하기에 벅찬 삶을 살고 있거나 그 호흡조차도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적 각박이 만들어 낸 신조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씹히는 스낵 같은 콘텐츠에 재미와 감동을 담아야 하며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누르도록 꼬셔야 내야 하며 궁극적인 브랜딩까지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름 트렌드 세터라는 사람들이 시대가 만들어 낸 트렌드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쉽쓸려 다닌다. 이제 소비자와 트렌드의 눈치도 봐야 하는 시대에 까지 이르렀다. 참 재미없고, 어렵고, 지겨운 일이다.
나는 넓은 업무 스팩트럼과 양질의 경험치를 쌓으며 동시에 크고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업무와 생리를 사랑한다. 그러려면 동시에 롱런(Long-run)할 수 있는 체력과 일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트렌드만을 민감하게 좇는 습관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근거를 찾아다니기보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브랜드가 가진 오랜 경험치를 사골국물처럼 뽑아내 설득을 해야 한다. 마트에서 옆 줄은 항상 내 줄보다 짧지만, 우리는 진득해질 필요도 있다. 트렌드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할 의무, 스낵 컬처를 버리면서 길고 논리적인 문장에 익숙해져야 할 동시의 의무가 있다.
부디 스낵 컬처를 심히 경계하길 당부한다. 그게 타성이 되어버리면 오리지널과 구심점을 쉽게 놓쳐버린다. 파생되는 다양한 트렌드나 신조어도 오리지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말은 뜬구름이 되며 힘을 잃기 마련이고, 이는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성취감과도 깊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목표와 지향점을 바라보길 바란다. 여기저기서 내미는 다양한 손가락들을 쳐다보며 우리의 커리어를 공백으로 메울 수는 없지 않은가?
-
- 매년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보자.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