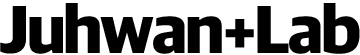나는 '일잘'인가, '일못'인가? 하루하루 쪼개듯 타성에 젖어 살다 보니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걸 잊고 살았다. 나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일잘과 일못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 있는가, 누구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한때 '일잘, 일못'이라는 키워드가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다. 페이스북에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그룹도 있는데 '일못 제보'와 '일못 고백' 글들이 넘쳐난다. 그렇다. 나도 그룹 회원이다.
두 회사를 다니면서 팀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예전의 팀장 역할과 지금의 팀장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 이전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감 있는 운영,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가 임무의 8~9할을 가져갔다면, 다음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수주 운영과 팀 구성원 관리가 각각 5할 정도의 책임을 필요로 했다. 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구성원 관리가 중요해 팀관리가 8~9할쯤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경험치가 매우 짧은 셈이었다.
끝나지 않을 '미생'의 삶
그렇게 요구되는 역할로 보면 나는 '아직'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 때, '을'의 대명사격으로 흔히 쓰인 '미생'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 팀 관리 영역의 부족한 경험치로 '완생'을 붙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치들이 더 쌓여 완생 할 여지가 있다면, 그래, 미생이란 단어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없겠다 싶었다. 지금 팀원들이 해내고 있는 실무의 지식들이야 이 바닥 10년 굴러서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일테고, 만약 지금도 못 해내고 있었다면 난 이 일을 애초에 접었어야 맞다. 하지만, 팀과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미생'에겐 무척 어려운 영역이다.
일의 잘함과 못함의 정의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신입사원이 대리 과장을 보는 시선과 학부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을 보는 시선이 다르 듯, 기준점과 평가점은 다 다르다. 나는 아마도 사람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에 있어서는 10년이 지나도 '이젠 잘 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완생'의 여지가 있으려나.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늘 '관찰'을 한다. 꼼꼼하게 그들의 표정을, 주말이 지나고 바뀐 머리 색깔을, 그들이 보낸 메일 한줄 한줄을.
관찰하듯, 작은 것을 챙기는 것
간혹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나도 일을 잘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라고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디테일(detail)'이다. 특히 신입사원은 디테일해야 하고, 특히 대리, 과장도 디테일해야 하고, 특히 팀장도 디테일해야 한다.
'디테일'의 힘은 굉장히 신비롭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때로는 의도를 넣어 반대의 경우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일못'을 '일잘'의 영역으로, 의외의 '하드 캐리(Hard Carry)' 역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쉽게 설명하면 '디테일'은 '작은 것을 챙기는 것'이다.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5분을 챙기고 선배도, 팀장도 사람이기에 그들이 흘리는 것들을 거두어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초년생에게 숲을 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숲을 볼 시간보다 눈치 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디테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다. 디테일의 근간은 '관찰'이기에 팀장이 팀원을 관찰하듯이 기획서 장표도 구석구석 살피고, 고객사나 상사의 코멘트를 유심히 살피고 분석해 내야 한다. 특히 군대 이등병처럼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지'하고 귀를 닫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온갖 잡소리를 듣고 해석하고 내 정보로 만드는 게 결국은 디테일이란 이야기다.
디테일의 부족함은 한 페이지 문서만 봐도 알 수 있다. 팀원이 제출한 문서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바빴는지, 말장난하는 건지,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그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어쭙잖은 관용어구로 도배하는 것이 업무적인 능력치를 대변하지 못한단 뜻이다. 단적으로 문서를 보게 될 사람을 챙기는 디테일은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 주고 그로써 먹기 좋게 만들어 준다. 그런 디테일이 필요하다. 팀장은, 팀은, 회사는 그런 디테일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웹툰 '미생'에서 사장이 장그래에게 보석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있다.
허겁지겁 퇴근하지 말고 한 번 더 자기 자리를 뒤돌아본 뒤 퇴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미생'과 '일못'들이 '완생'과 '일잘'로 거듭나는 건 어쩌면 이런 사소함 때문이리라. '일잘'과 '일못'을 구분 짖는 것이 이 '디테일'이라고 정의한다면,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센스쟁이가 되길 바란다. 디테일이 완성도가 되고 배려가 된다면 우리, 지금 보다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최소한 직장생활만이라도.
-